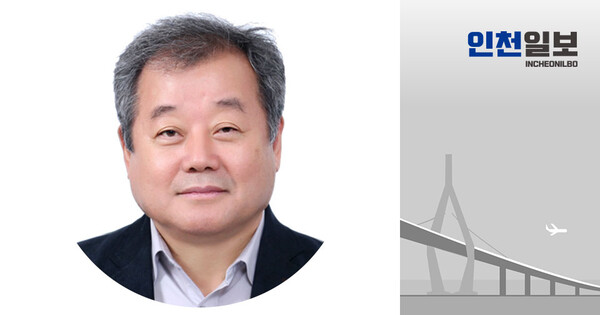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다. 국가가 의병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초청되어 헌화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름 없이 싸우다 전장에서 쓰러진 한말 ‘무명의병’들이다.
한말 의병전쟁에 참전한 이들은 14만 명을 넘는다. 그중 기록이 남아있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불과 2700여 명에 불과하다. 한말 전체 의병의 2%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말 의병 전쟁에서 전사한 의병이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이는 극소수라는 점이다. 의병 대다수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 무명의병이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바깥에 서 있다. ‘의병의 날’에도 초대받지 못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잊은 이유는 명확하다. 역사 연구는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독립유공자 서훈도 기록을 통해 공적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무명의병은 자연스럽게 역사 연구에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도 제외되었다. 존재는 있었지만 목소리는 남지 못했고, 이름은 사라졌다.
대다수 의병이 기억되고 있지 못하다
한말 의병 대부분은 여전히 기억되지 않고 있다. 기록이 남아있어 한말 의병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병 출신 독립유공자의 활약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다. 그러나 의병전쟁은 의병장만의 역사가 아니다. 십만이 훨씬 넘는 민초들의 분노와 헌신이 만든 저항이었다. 의병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을 떠올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의병이 의병전쟁의 주역이었다면, 우리는 왜 그들의 이름을 몰랐을까?” “왜 기억은 이토록 좁게 작동했을까?” 그리고 “이대로 괜찮은가?”
의병 기록은 크게 의병 측 기록과 일본 측 기록 두 종류가 존재한다. 특히 일본 측의 재판 기록은 포로로 잡힌 의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연구의 주요 자료로 쓰인다. 의병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사한 의병은 ‘사살 폭도 00명’의 통계 숫자로만 남아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없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의병 중 전사 의병은 극소수이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역사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과연 역사의 주체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는 무명용사를 기억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 공원, 러시아 알렉산드로프 공원에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다. 이곳은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여 헌화하고, 국민이 경의를 표하는 장소다.
‘무명의병 기념광장’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국가 중심 광장인 광화문광장 한복판, 혹은 용산공원 어딘가에 무명의병을 기억하는 공간, ‘무명의병 기념광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나서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미 무명의병 기억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사업을 시작했다. 인천시와 다른 자치단체들도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다. 이 기억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무명의병의 이름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을 기억할 수는 있다. 이름 없는 무덤에 꽃을 올리고, 그들이 싸운 전장을 찾아 걸으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확실한 계승이다.
가족과 마을을,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총을 들었으며, 고요히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오직 이 땅의 바람과 흙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묻는다. “무명의병, 21세기에는 어디에 둘 것인가.” 역사의 한복판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억 밖의 변두리인가.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무명의병포럼 대표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